2022. 10. 15. 09:26ㆍ기공 강의 연구 자료/생명이란?
생명이란?
“생명 (생물학·철학) [生命, life]
생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개념.
생명은 생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이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에 근거한 몇 가지 정의가 사용되어 왔는데, 그것은 생리학적·물질대사적·생화학적·유전적·열역학적 정의이다. 그중 생리학적 정의는 오랜 세월 동안 선호되어온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생명은 섭식, 물질대사, 배설, 호흡, 이동, 성장, 생식,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는 계(系)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기계도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며, 일부 생물들은 호흡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
물질대사적 개념은 일부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자신의 물질을 끊임없이 외부와 교환하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잃지 않고 체제의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물체로 정의한다. 생화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체는 핵산 분자에 생식가능한 유전정보를 암호화하여 가지고 있고, 단백질성 촉매인 효소를 사용하여 물질대사의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계로 정의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단순한 세포에서 복잡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유전학적 정의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유기물질·행동양식·구조 등을 복제하는 존재들이다.
열역학적인 면에서 보면 생명체는 개방된 계로 볼 수 있으며, 열·빛·물질 등 우주의 무질서를 통해 자신의 질서를 증가시키는 어떤 국소 부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각 정의에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정의란 불가능하며, 주로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을 통해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1s2894b )
“생명 [生命, life]
요약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다
본문
어느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생물과 그 활동을 통틀어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까지 내려진 생명에 관한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생물학의 발달과 더불어 생물의 특성으로 열거되어 온 것은 유기물질을 바탕으로 구성된 생체유기물질(生體有機物質)의 생산,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되는 성장 ·구성 ·조절성 ·자극반응성 ·물질대사 ·증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가지고 생명을 정의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에서도 앞에 든 것과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다든지 이러한 생물의 특성을 기계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엄밀히 정의하기는 지극히 곤란하였다. 그렇지만 상당히 널리 보급된 정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F.엥겔스에 의한 “생명이란 단백질의 존재양식이다.”라는 정의가 그것인데, 이 정의는 물질대사를 생명현상의 기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정의는 생물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대사는 효소라는 단백질이 주체가 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물질대사에 대해 주목한 것은 생물체가 끊임없이 물질의 출입과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전환 및 출입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일이다. 생체론(生體論)에서는 이러한 동적평형(動的平衡)과 위의 계층구조(階層構造)를 생명현상의 두 가지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동적평형이 뜻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붕괴(崩壞), 즉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 생(生)과 사(死)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40년대에 이르러 핵산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단백질 또는 물질대사만으로 생명을 정의한다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되었다. 핵산 중에서도 DNA는 유전자의 본체이어서 증식의 기초가 되는 물질이므로 물질대사보다는 오히려 증식이 생명의 기본적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거의 모든 생물체의 현상이 피드백(feedback)조절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생명이란 제어(制御) 바로 그것이다.”라는 정의도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정의에서는 생물과 자동제어기계(自動制御機械)가 혼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인간의 부속물로 간주하면 된다는 것이 이 제안 속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8231 )
“생명의 기원
자연발생설
생명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17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1668년 F. 레디가 썩은 고기를 병 속에 넣어두고 파리를 접근시키지 않으면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실험을 시작으로 18세기 중엽 L. 스팔란차니의 끓여서 밀폐한 고기즙 실험과 19세기 L. 파스퇴르의 실험으로 생물이 무생물에서 생긴다는 자연발생설은 완전히 부인되었다. 파스퇴르는 목이 긴 S자형의 플라스크에 고기즙을 넣어 멸균하면 공기와 접해도 고기즙이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미생물도 모체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 것을 알았다. 이로써 자연발생설은 반증되고 모든 생물은 생물에서 생긴다는 생물속생설이 확립되었다.
진화설
자연발생설의 부인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진화설이다. 1859년 C. 다윈의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으로 등장한 진화설에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원시 생명체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최초의 간단한 생물은 자연발생했고 이것이 진화를 통해 많은 종류의 생물로 변화했다는 신자연발생설이 등장했다. 신자연발생설을 주장한 E. H. 헤켈은 19세기 후반까지의 연구가 모두 유기물질의 분해물을 포함하는 액 속에서의 자연발생을 다루었다고 했으며, 이 자연발생을 'Plasmogonie'라 하고 무기용액 중에서 원시생명의 발생을 'Autogonie'라고 했다.
생명우주기원설
최초의 생명체가 우주공간에서 지구로 도래했다는 생각이다. 1865년 E. H. 리히터는 코스모조아설(또는 胚種說)을 주장하여 생명의 배종인 코스모조아가 우주공간에서부터 지구상에 운반되어 생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운석을 타고 코스모조아가 왔다고 하며 우주에서 생긴 포자가 빛의 방사압에 의해 왔다고도 했다. 이것들은 지구의 최초 생명체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생명의 기원 장소를 우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설 중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은 지구의 원시생명이 유기물의 진화로 일어났다는 러시아의 A. I. 오파린 학설이다. 오파린은 유기화합물은 생물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 이미 생성되어 있었고, 이 화합물에서 생물이 발생했다고 했다. 즉 원시지구는 생명이 없는 물질의 세계였으나 이 물질들이 계속 화학변화를 거듭하여 유기물질들이 생성되었고 코아세르베이트(coacervate)를 거쳐 마침내 생명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코아세르베이트는 친수성의 콜로이드나 고분자의 용액에 침전제 등을 가하면 액상(液相)이 둘로 분리되어 생기는데 이 코아세르베이트를 오파린은 원시생명의 시초로 보았다. 이렇게 생성된 코아세르베이트가 무수히 생겨나고 점점 발전하여 에너지를 획득하는 능력을 지님으로써 코아세르베이트에서 발전된 종속영양생물이라는 원시생명체가 등장했을 것이다. 이러한 종속영양생물들은 효소작용으로 무기호흡을 하게 되었고 이산화탄소(CO2)를 방출하게 되고 자외선을 차단하게 됨으로써 유기물의 자연합성이 감소되어 원시적인 독립영양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독립영양생물이 광합성으로 산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를 바탕으로 생명의 기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파린 이후 H. 유리, S. 밀러, C. R. 우스, S. 폭스 등의 계속된 실험을 통해 이 가설은 대부분의 과정이 증명되었고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원시 지각과 대기를 구성하고 있던 유기물질인 암모니아, 수증기, 메탄, 수소에서 자외선이나 전기방전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티드, 염기, 카르복시산, 알데히드 등의 단위체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중합반응을 통해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중합체가 된 후 세포의 형태를 갖추고 자연선택을 통해 보다 복잡한 다세포 동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RNA가 중합체 중 가장 먼저 생겨나 자기복제가 가능한 최초의 유기체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축적됨으로써 자기복제라는 무생물과 생물의 연결고리 부분이 해결되어 가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비가 과학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1s2894b023 )
“자연발생설
생물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무기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설로 이 설에 의하면 생물은 어버이가 없이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이후 논쟁되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퇴르의 실험에 의해 이 가설이 거짓임이 확증되었으며, 그 결과 생물은 결코 자연발생하지 않는다는 생물속생설이 확립되었다.
이 설에 의하면 생물은 어버이가 없이도 생길 수 있다. 자연발생에 관한 최초의 관념은 민달팽이 ·개구리 ·쥐 등이 돌연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척추동물뿐만 아니라 고등척추동물도 자연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17세기에는 독에서 쥐의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처방이 발표되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레디(Francesco Redi)가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자연발생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제시하였다. 18세기 초 끓인 육즙 속에서 미생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적어도 미생물만은 자연발생된다는 니담(John T. Needham)에 대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을 스팔란차니(Lazzaro Spallanzani)가 실험으로 제시하였다.
18세기 중엽에는 자연발생에 대한 논쟁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 논쟁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실험에서 완전히 끝을 맺었다. 그는 끓인 고기즙에 공기는 통하면서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S자형 플라스크를 만들어 두었더니 고기즙에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에 따라 세균의 자연발생이라는 것은 공기 속의 포자(胞子)가 침입하여 번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여 자연발생설을 부정하였다. 파스퇴르는 이 실험으로 생물은 결코 자연발생하지 않는다는 생물속생설을 확립시켰다.
포자범재설
19세기 초엽에 프랑스의 학자 몽리보는 생명의 씨앗을 지닌 천체 조각들이 지구에 도달함으로써 지구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19세기 중엽에 리히터에 의해서 더 발전되었다. 그는 천체가 빠른 속도로 운동할 때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왔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그의 학설을 전개하였다. 그는 생명력을 가진 미생물의 포자들이 이러한 천체 조각들에 묻게 되었고, 이 조각들이 별들 사이의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구나 다른 행성에 내려앉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행성의 습도와 온도가 적합하면 포자들은 그 곳에서 성장하여 지금 그 행성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스웨덴의 유명한 물리화학자 아레니우스는 1906년에 리히터의 학설과 비슷한 포자범재설이라는 학설을 제창하였다. 그는 생명의 씨앗이 빛 또는 우주선의 복사압력에 의해서 다른 행성에서 지구까지 밀려 왔다고 하였다. 아레뉴스는 직경이 약 0.2㎛ 되는 세균의 포자가 태양계로부터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 약 9,0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을 하였다.“
(출처: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3%9D%EB%AA%85 )
생명의 정의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생명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지만 엄밀하지는 않다.
물질대사에 바탕을 둔 정의
1. 성장한다.
2. 물질대사를 한다.
3.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움직인다.
4. 자신과 닮은 개체를 생산해 내는 생식기능이 있다.
5.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위의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 불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으므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 바이러스는 성장하지 않고 숙주세포 바깥에서는 생식을 할 수 없으므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6. 살아있는 생명체는 탄수화물, 지질, 핵산, 단백질과 같은 성분을 지니고 있다.
7.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와 물질을 모두 필요로 한다.
8.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나 그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9.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10. 살아있는 생명체의 종은 진화한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점이 모든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도 해당한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이 현상을 '탄소 쇼비니즘(탄소 배타주의)'이라고 부른다.
생화학적(분자생물학적) 정의
1. 생물(生物) : 생명이 있는 것
2. 생물을 구성하는 생화학적 분자들
1).단백질
2). 지방(지질, 지방산)
3). 탄수화물
4). 핵산(DNA, RNA)
3. 효소반응 : 단백질로 만들어진 생체 촉매
현대생물학의 기본 패러다임 : 분자생물학
단백질의 효소와 생합성을 지배하는 디옥시리보핵산 또는 디엔에이(DNA)의 구조와 특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생명현상을 설명하려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분자생물학의 발달은 1940년대에 DNA가 유전자의 본체임이 밝혀지고, 동시에 DNA의 유전정보가 RNA를 통하여 세포질 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차츰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이 1953년 J.D.웟슨과 F.H.C.크릭에 의하여 DNA의 이중나선구조의 모형이 제출됨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그 후, 분자생물학의 주류는 DNA의 복제 및 단백질의 생합성을 중심으로 하여 유전의 본질 및 유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나아가서 생물체의 조절작용이나 진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분자생물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분자유전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육의 기본이 되는 수축단백질인 액토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의 분자구조를 바탕으로 근육의 수축운동을 설명한다든지, 뇌에 있어서의 기억의 기작을 단백질이나 RNA의 미세한 구조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일 등도 분자생물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전학적 정의
다윈의 <종의 기원>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1809년~1882년)의 생물의 진화론에 관한 저서로서, 1859년 11월 런던의 존 머리사(John Murray社)에서 간행하였다. 다윈은 1858년 7월 1일 린네 학회에서 A.R.월리스와 함께 진화론의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요약 형식으로 이 책을 간행하였다. 전문 14장으로 구성되고, 변이(變異)의 법칙·생존경쟁·본능·잡종(雜種)·화석(化石)·지리적 분포·분류학 및 발생학 등의 여러 면에서 자연선택설을 전개하고 있다. 1872년에 간행된 제6판이 최종판인데, 이때 과학적으로 제기된 여러 이론(異論)에 답한 새로운 한 장(章)이 제7장으로 추가되었다.
W.페리의 자연신학(自然神學)의 토대였던 적응의 현상에 자연적 설명을 부여하려는 것이 이 책을 간행하게 된 목표 중의 하나였다. 간행 직후부터 종교계의 심한 공격을 받았으나, 약 10년 동안 생물학상 확고부동한 지위를 획득하고, 신앙에 대하여 사상 최대의 타격을 가한 저서로 알려져 있다.
멘델의 유전법칙
멘델(G.J. Mendel)이 완두콩을 이용한 교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유전법칙. 1865년에 처음 발표되어 유전학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멘델 이전에는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 속에 있는 액체가 섞여서 부모의 특징이 이어진다는 혼합 이론을 사용하였다. 이 이론에 대항하여 멘델은 부모의 특성, 즉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위로 환원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 냈다. 멘델 스스로는 여기에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유전자이다. 즉 멘델은 그의 법칙을 통해 유전자 개념을 처음 과학적으로 확립한 셈이다. 그러나 당초 1865년에 멘델이 처음 이 법칙을 발표했을 때에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완전히 묻힌 것은 아니고,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멘델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었으며 1881년에 나온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도 멘델의 연구가 소개되어 있었다. 그러다 1900년에 코렌스(C. Correns), 체르마크(E.V. Tschermak), 드 브리스(H. de Vries)가 유사한 연구를 하다가 동일한 시기에 멘델의 연구를 다시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중에서 코렌스가 멘델의 연구 성과에 "멘델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멘델의 연구
멘델은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완두콩을 그 재료로 사용했다. 우선 완두콩을 잘 키워서 키가 큰 완두콩과 키가 작은 완두콩을 서로 분리해 낸다. 이렇게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이 각각 완두콩의 형질이 된다. 키가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키우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따로 키워서, 몇 세대 후에는 무조건 키가 큰 종자와 무조건 키가 작은 종자를 얻는다. 이 완두콩들을 서로 교배를 시켰더니 키가 큰 완두콩이 나오는 종자만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 발상으로는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의 중간 키 정도가 되는 완두콩이 나와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형질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며, 이 때 나타나게 되는 키가 큰 형질을 우성, 반대로 나타나지 않는 키가 작은 형질을 열성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이렇게 얻은 완두콩을 자가수분을 거쳐 다시 키워 보았다. 그러자 키가 큰 완두콩과 작은 완두콩의 비율이 3대 1로 나타났다. 이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한 멘델은 완두콩의 키 이외에도 다른 형질로도 실험을 했다.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 그리고 녹색 완두콩과 노란 완두콩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서로 다른 형질은 상관관계가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을 나타냈다. 이것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멘델의 법칙이다.
멘델의 재발견
멘델의 법칙은 1884년 멘델이 사망한 후 16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00년에 와서 세 명의 연구자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다. 네덜란드의 드 브리스는 1890년대에 달맞이꽃을 가지고 독자적인 실험을 해서 멘델의 법칙을 발견했으며 1895년에 멘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독일의 코렌스는 완두콩으로 실험을 해서 1899년에 멘델의 법칙을 다시 발견했으며 이때 멘델의 논문을 다시 읽어보았다고 한다. 그 후 멘델과 같은 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논문 발표를 꺼리고 있다가 1900년에 드 브리스가 발표하기 직전의 논문에 멘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고 멘델을 소개하기 위해 "멘델의 법칙"이라는 논문을 썼다. 사실 드 브리스의 논문에는 멘델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번역하는 도중에 빠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체르마크는 오스트리아에서 역시 완두콩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으며 드 브리스의 논문을 보고 급히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여, 세 사람의 논문은 같이 게재되었다.
멘델 법칙의 한계와 발전
멘델의 법칙은 매우 훌륭한 이론이었으나 이후 연구가 계속되어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더욱 잘 알게 된 이후에는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독립의 법칙은, 해당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이것은 멘델이 매우 운이 좋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완두콩의 상동염색체는 모두 7쌍(2n = 14)이며, 멘델이 확인한 7개의 형질은 모두 각각 다른 상동염색체에 있는 형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열의 법칙이나 분리의 법칙도 완전한 법칙은 아니다. 불완전우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간유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델의 법칙은 그 전까지 수학적인 방법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생물학에서 통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확한 가설을 제시한 이론이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한 유전학을 처음 정립한 법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복제
유전물질이 자기복제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유전물질의 생합성은 1개의 어미 분자가 주형이 되어 그것과 똑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끼 분자 2개가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것은 반보존적 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전물질로서 DNA와 RNA는 고분자화합물이며 생세포 속에서 이 유전물질의 합성은 일련의 생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유전물질의 생합성만을 복제라고 하는 것은 1개의 어미 분자가 주형이 되어 그것과 똑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끼분자 2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전물질의 자기증식은 모두 반보존적 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변이
같은 종의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 모든 생물 종(種:species)은 서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며 자신과 닮은 모습의 자손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 내의 생물은 완전히 같은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으며, 또한 이들이 남기는 자손 역시 부모의 형태와 어느 정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개체간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변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변이는 각 개체가 가지는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형질(形質: character, trait)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변이에는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유전변이와, 개체가 성장해 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생기는 환경변이 두 가지가 있다. 유전변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학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지만 환경변이는 발생과 성장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개체가 가지는 키, 몸무게, 형태를 비롯하여 동물의 행동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세세한 차이는 모두 변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과 자라면서 형성되는 것이 있으며 때로는 이 두 가지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돌연변이
유전변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생식세포를 통해 이어내려오는 유전자 내용을 통해서 자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유전변이 중에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DNA 서열(序列: sequence)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완전히 새로운 변이도 있는데 이는 돌연변이(突然變異: mutation)라고 한다. 돌연변이는 그렇게 잘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없던 완전히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때문에 이러한 돌연변이는 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생물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변이와 생물학
변이는 개체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체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체변이라고 할 때는 유전변이와 환경변이 중에서 후천적인 환경변이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환경변이는 개체가 태어난 후에 유전자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손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의 진화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이, 즉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도 유전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으나 현재의 진화론, 특히 신다윈주의(Neo Darwinism)에서는 이러한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라마르크(J.B. Lamarck)가 용불용설(use and disuse theory)을 통해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진화론을 만든 다윈(C. Darwin)도 판게네시스(pangenesis)라는 유전 이론을 통해 획득형질이 유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멘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부정되었으며, 현대 생물학에서는 환경변이가 유전된다고 보지 않는다. 때문에 현대 생물학 연구에서는 환경변이보다는 유전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대 생물학은 전체 변이 중에서 유전변이가 나타나는 비율을 유전율(heritabilit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적응(자연선택)
생물의 형태나 기능이 환경조건에 잘 적합하여 개체와 종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이 진화과정에 의하여 성립되어 온 것을 말한다. 보통은 개개의 형질에 대해 그것이 생존 또는 번식하는 데 있어 유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꿀샘의 존재는 곤충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형질이다.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이 진화과정에 의하여 성립되어 온 것을 말하기도 한다.
어떤 생물도 종족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적합한 형질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보통 적응이라고 할 경우에는 개개의 형질에 대해 그것이 생존 또는 번식하는 데 있어 유용한 것을 말한다. 식물의 꽃잎이 3개냐 5개냐 하는 것은 반드시 적응에 관계되는 형질은 아니지만, 꿀샘의 존재는 곤충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형질이며, 꽃잎에 곤충이 앉았을 때 화분이 곤충의 몸에 잘 묻도록 되어 있는 꿀풀과(科)나 난초꽃의 구조에서는 적응이 한층 두드러진다.
그러나 어떤 형질이 적응된 것인지 아닌지, 또 적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의 판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집단유전학에서는 어떤 유전자형과 그에 대립하는 유전자형이 다음 대에 남기는 번식가능한 자식의 수의 상대값을 기준으로 하여 적응값의 개념을 세우고, 이것을 적응현상의 수량적 표현으로 삼고 있다. 즉, 몇 개의 대립하는 유전자형이 있을 때, 다음 대에 남기는 번식가능한 자식의 수가 최대인 것의 적응값을 1로 하고, 다른 것은 이것과의 상대값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한 개체가 성장하는 동안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나타낼 때, 그것을 적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광의 조사를 많이 받는 생활을 계속하여 피부에 색소가 증대되어 몸을 방호(防護)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급히 달릴 때 숨이 가빠지거나 또는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눈동자의 크기가 조절되는 것 등의 일시적 변화는 순응(順應)이라 하여 적응과는 구별된다. 또한, 한 개체만의 변화도 조절 또는 순응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진화에서 생활조건이 현저하게 변화하여 어떤 형질이 부적합한 채로 잔존되거나, 발달하거나 하면 그 생물은 멸망에 가까워진다.
종의 분류
• 종, 속, 과, 목, 강, 문, 계
•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군류계, 동물계
• 세 가지 류 : 진세균류, 시원세균류, 진핵생물류
• 진핵생물류의 4가지 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류계, 동물계
용불용설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여 없어지게 된다는 학설로 J.라마르크가 제창한 진화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새로운 종(種)의 진화 원인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즉, 많은 동물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형태나 작용을 갖는 기관은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이며, 또한 퇴화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흔적기관(痕跡器官)도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라마르크(Jean-Baptiste Lamarck)는 1809년에 출간한 《동물 철학 (Philosophie Zoologique)》에서 생물종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기본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동물 철학》에는 진화가 일어나는 기본 법칙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첫 번째 법칙은 종 내에서 특정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기작에 대한 설명이며, 두 번째 법칙은 그러한 변화가 번식 과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짐으로써 종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용불용설은 한 개체에서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첫 번째 법칙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의 이론을 형질전환 이론(theory of transformatio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용과 불용(Use and Disuse)
라마르크의 이론은 동물의 형질이 변화하는 기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물이 어떤 기관을 다른 기관보다 더 자주 쓰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관은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점차 강해지고 발달되며 크기도 커지게 된다. 반면, 어떤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점차 약화되고 기능도 쇠퇴하여 결국 사라지게 된다.
용불용설의 개념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예로 기린의 목이 늘어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기린은 일생 동안 높은 가지에 있는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늘이는 것을 되풀이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결과 기린의 목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라마르크는 기린이 목을 늘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완벽함을 향한 자연적인 경향성 (natural tendency toward perfection)"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라마르크가 이용한 또 다른 예는 물새의 발가락이다. 물새는 물을 가로지르며 수영 하는 행동에서 발가락을 늘이는 노력을 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수영하기에 더 적합한 길고 물갈퀴가 달린 발가락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예는 어떤 기관을 사용함에 따라 그 형질이 변화하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같은 맥락으로, 라마르크는 어떤 기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형질이 약화되어 축소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로 들어, 펭귄의 날개는 날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되어 점차 퇴화되어 작아졌을 것이다. 용불용설은 많은 동물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형태나 작용을 갖는 기관은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이며, 또한 퇴화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흔적기관(痕跡器官)도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획득형질의 유전(Lamarckian Inheritance)
개체 수준의 변화는 번식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유지될 수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라마르크는 획득형질이 유전되는 기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개체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어떤 기관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결과로 얻은 기관의 변화는 번식에 의해 새로 태어나는 개체로 전해진다. 획득된 형질은 그 변화가 부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거나 적어도 암컷이 형질을 획득한 경우에 유전될 수 있다.
그는 한 개체가 일생 동안 획득한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믿었다. 기린의 경우, 목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긴 목을 얻은 개체의 자손은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아 긴 목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환경의 변화가 생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는 특정 기관의 발달이나 퇴화를 유도한다. 이는 자손에게 전해져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뚜렷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종의 점진적인 변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라마르크 이론의 한계와 의의
라마르크의 첫 번째 법칙은 종의 다양성이 생기는 기작을 설명하기에 적절했지만, 두 번째 법칙은 경험적으로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멘델(Gregor Mendel)이 유전의 분자적인 특성을 밝힘으로써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르크의 이론의 의의는 종의 다양성이 생겨나는 기본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로부터, 진화적인 변화는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현대 진화이론이 발전하였다. 그는 고대의 바다 조개를 연구하면서 오래된 것일수록 생김새가 단순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은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여 끊임없이 복잡한 것을 지향한다고 결론지었다.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생존경쟁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함축한 말이다. 이 말은 다윈(C. Darwin)의 진화론에 대한 원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윈이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스펜서(H. Spencer)가 1864년 "생물학의 원리(Principles of Biology)"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했다.
용어의 역사
1851년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서술한 "사회 역학(Social Statics)"이나 1862년의 "철학의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첫 번째 원리(First Principles of a New system of Philosophy)"까지도 스펜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이 때는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을 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적자생존은 스펜서의 1884년 저서인 "개인 대 국가(The Man Versus The State)"에서 더욱 강하게 사용된다. 그는 여기서 더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살아남아 시장을 점령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경향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회사는 경쟁에 의해 도태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종의 기원" 4판까지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인 월래스(A.R. Wallace)는 선택(selection)이라는 용어가 인위적인 느낌을 가진다고 생각했고, 다윈도 결국 거기에 동의한다. 그래서 스펜서의 "생물학의 원리"에서 경제학과 생물학을 동일선상에 놓고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착안, 1869년에 나온 "종의 기원" 5판에서는 자연선택과 동일한 의미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다윈은 여기서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를 만든 공적을 모두 스펜서에게 돌리고 있으며 자연선택에서 인위적인 느낌을 제거했다는 면에서 이 문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는 진화론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구처럼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우생학(優生學: eugenics)까지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진화생물학에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게 되었으며 현재 자연선택과는 다른 의미로 보고 있다.
용어의 의미
적자생존은 본래 영어: survival of the fittest의 번역 용어이다.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이 된다. 이 의미는 적자생존이라는 번역 문장이 되면서 "가장 강한 자의 생존"이라는 식으로 주로 생각되지만,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은 이 "적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적합은 환경에 대한 적응도(fitness)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이 적응도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강함이나 약함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생물학에서 적응도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다음 세대로 가는 일종의 번식 성공률(reproductive success)으로 본다. 또한 적자생존은 순환적이라는 부분에서 자주 공격을 받아 왔는데 즉 "살아 남기 때문에 적합하고", "적합하니까 살아 남는다"는 식의 순환논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논리라는 약점 때문에 현대 진화생물학에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3%9D%EB%AA%85 )
“창조론[創造論, doctrine of creation]
요약
우주 만물이 어떤 신적 존재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
본문
창조론에 대한 생각은 고대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에누마 엘리쉬(메소포타미아의 우주론적 사본)이며, 그외 수메르의 에아 신화, 이집트의 라에 의한 창조 등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는 유일신인 하느님이 태초에 완전한 자유의 입장에서 무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가리킨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창조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 근본적인 개념이다. 창조의 개념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창조의 인식은 신앙의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 창조자와 창조에 대한 교회의 인식은 “새로운 피조물”(고린도후서 5:17)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확실성에 근거한다. 구원의 체험에 의해 비로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인식케 한다. 창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서, 제작이라는 말과 구별된다. 제작은 이미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만들지만, 창조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성서에서의 창조는 하느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고 이를 유지하며 그 목적을 달성한다. 하느님은 맨 처음 빛을 창조하였고, 이어서 물과 하늘, 흙과 식물, 천체, 물고기와 새, 동물, 기는 것, 인간의 순서로 6일간에 걸쳐 창조하였다.찰스 다윈(Charles Darwin )이 주장한 진화론의 등장으로 창조론은 위협받았다. 더욱이 진화론적 철학이 교육을 비롯하여 정치, 종교, 산업 등 전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교과서의 교육과정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곳이 늘었고, 과학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생겨났다(창조과학회 등). 이들은 진화론의 과학적 허구성을 밝히고, 창조의 과학적 타당성을 밝히려 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창조론은 첫째, 우주는 하느님의 행위에서 나왔으며, 하느님에 의존적이다. 둘째,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자유적 활동(필연성이나 충동에서 나오지 않음)이다. 셋째,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는 도덕적, 영적인 목적을 두었다. 넷째, 하느님 자신의 생명과 복을 피조물에게 전달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하느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추진되며 완결되는 것이다(골로새서 1:15~17, 에베소서 1:3~5, 로마서 8:21).“
(출처: NAVER 백과사전)
“창조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창조론(創造論, Creationism)은 인간, 삶, 지구, 우주가 신이나 뛰어난 존재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 신비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 '개입'은 완전한 무에서의 창조일수도 있고, 이전에 있던 혼돈에서의 질서의 출현일 수도 있다. 특히 현대에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진화론이나 천체물리학, 기타 자연 세계의 기원에 대한 관점이 있는 과학 등의 관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창세기 경전과 이슬람교의 코란에서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 묘사하면서 유일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를 과학 이론인 생명체의 진화론과 대립되는 관점에서 창조론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는 과학 이론과 종교적 믿음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한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생명의 창조론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노력 역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창조과학이라고 부른다. 또한 더욱 발전된 형태의 창조과학으로서 지적설계운동도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해 증거를 취사 선택한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창조론을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문제가 재판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생명의 진화와 우주의 생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에 신의 개입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도 있으며, 성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며 단지 신앙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류
기독교 내의 창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분류는 성경을 그 문자그대로 믿는 입장과 혹은 성경의 창조기사는 비유와 은유이며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기인하여 나뉘게 된다.
젊은 지구 창조론
젊은 지구 창조론(young earth creationism)은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의 나이는 6,000-10,000년이고 최초의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근본주의 계열의 기독교 내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20세기 후반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역사가 깊지 않은 주장이다. 창조과학 운동이라고 불리는 시도도 상당 부분 이 젊은 지구 창조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진화론은 물론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질학 등 대부분의 현대 과학 이론을 부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랜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old earth creationism)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인정하고 긴 시간에 걸쳐서 개개의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창세기의 창조가 문자적인 6일에 이루어져 있다고 해석하지 않고, 날-연대 이론 (day-age theory)등의 설명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또는 간격론 (gap theory)으로 제시된 것과 같이 창조는 6일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긴 시간이 존재했던 것으로 설명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의 나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이 이론은 과학계의 많은 이론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창세기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에서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역시 진화론의 과학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과학계와의 갈등은 여전히 안고 있다.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대부분 수용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창조의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이론이다. 과학과의 갈등 요소가 없고, 신학적으로도 충실한 해석이기에, 기존 창조론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많은 기독교 계통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창조론 진화론 논쟁에 있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유신진화론을 기독교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이는 과학적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유신진화론의 사상적 뿌리는 일부 교부들의 6기간적 견해, 아리우스주의에 뿌리를 둔 유니테리언, 범신론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을 수용한 스콜라철학 및 큐비에의 다중격변설, 근세의 자연발생설과 세속인본주의 및 벨하우젠의 문서가설, 벨그송의 생의 철학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19세기말부터 카톨릭과 개신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의 내부로 유신진화사상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유신진화론의 공통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1.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나 진화를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에 따라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사역에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며, 모든 자연계의 작용은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2. 아담이 탄생하기 전(Pre-Adamic Age) 긴 지질연대가 있었다. 그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이 그 해당되는 지층 속에 묻히면서 무기질과 치환된 것이 오늘날의 화석이다.
3. 하나님이 한 유인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현생인류인 아담을 만드셨다.
4.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 기록이 아닌 문학의 장르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한다.
1. 성경을 상징적이거나 상황적으로 해석한다.
2. 특수계시(성경)보다 자연계시(자연법칙)를 더 중시한다.
3. 과학과 성경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해석(Compartmentalism)에 근거하고 있다.
성서해석학적 문제
이러한 다양한 창조론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뿐 아니라,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3장의 기록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창세기의 해석 방법으로 문자적 해석을 취할 경우는 젊은 지구 창조론과 같은 근본주의적 해석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문자적이 아닌 문학적 상징적 언어로 해석하는 골격 해석(framework interpretation)등 다양한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진화론[進化論, evolution theory]
요약
좁은 의미에서의 생물 진화요인(進化要因)에 관한 학설
본문
넓은 의미로는 생물의 진화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화론의 역사를 개관하기로 한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 중에는 사물의 생성(生成)문제를 논한 사람이 많았다. 그 중 한 사람인 엠페도클레스는 지(地) ·수(水) ·풍(風) ·화(火) 4원소의 결합 분리로 경험세계의 생멸(生滅)의 사실을 설명하려 하였고, 동물체의 여러 부분이 발생하여 지상에서 결합되었다고 했으며, 아낙사고라스는 사람은 물고기 모양의 조상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흔히 사람들은 이들의 설이 진화관념의 효시라고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의 여러 부류(部類)가 완전의 정도에 따라 관계적으로 연쇄를 이루어 배열되어 있다는 자연의 단계(scala naturae)를 설명하여, 이것이 근세에 와서 동물을 하등한 것과 고등한 것으로 분류하게 하고 진화사상을 낳게 한 토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자신에서는 진화의 관념을 찾을 수 없다.근세에 들어와서 진화사상이 어느 정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엽 프랑스에서였다. P.L.M.모페르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서 《사람 및 동물의 기원》(1745)에서 식물과 동물의 종(種)의 변화에 관해 기술했는데 자연선택(自然選擇)의 원리가 예견된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G.L.L.뷔퐁은 《박물지》 제1권(1749)에서 지구의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의 여러 권에서 생물의 변화문제에 언급하였는데 생물은 환경의 영향, 특히 온도와 먹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변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전후의 기술에 모순이 있어 그를 진화론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P.H.D.올바크는 《자연의 체계》(1770)에서 인간을 확실히 자연의 역사적 변화의 소산이라고 하였다. 그 무렵 D.디데로와 같은 혁신적인 철학자들이 진화사상을 고취하였다. 아무튼 진화론이 프랑스의 학계와 사상계에 움트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며 그 배경은 뉴턴 역학의 기본적 관념이 프랑스에 보급되어 자연의 인과적(因果的) 변화의 관념이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세기 말 영국에서 E.다윈이 《주노미아:Zoonomia》(1794∼1796)에서 생물계의 법칙성을 논하면서 생물의 욕구(欲求)가 작용을 일으키며, 그 결과 진보하고 대를 이어감에 따라 진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J.라마르크의 한 선구자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설은 아직 체계화된 것은 아니었다. 체계적인 진화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라마르크이다. 그는 《동물철학》(1809)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동물분류학 ·생명론 ·감각론과 함께 진화사상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 《척추동물지》 제1권(1815) 서론에서 다시 이것을 논하였다.
라마르크는 무기물에서 자연발생(自然發生)한 미소한 원시적 생물이 그 구조에 따라 저절로 발달하여 복잡하게 된다는 전진적(前進的) 발달설과 습성에 의해 획득된 형질이 유전함으로써 발달한다는 설을 함께 설명하였다. 그는 전자로는 큰 동물 부류들이 단계적으로 배열됨을 설명하고 후자로는 종의 다양성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동물은 내부감각으로 생기는 욕구로 진화한다고도 하였다. 라마르크의 학설은 당시에 실증적(實證的)인 생물학이 대두되고 있는 때였으므로 허무한 사변(思辯)이라고 묵살되거나 배격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비교해부학자 ·분류학자였던 창조론자 G.퀴비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진화론을 확립한 사람은 E.다윈의 손자인 C.R.다윈이다. 그는 저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서 자연선택설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종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는 데 변이(變異)의 원인 중의 한 가지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用不用說)도 채용하였다. 그러나 다윈은 라마르크의 ‘전진적 발달’을 배격하였다. 다윈은 자연선택설을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진화의 증명이 될 수 있는 생물학상의 사실적인 예도 많이 들어 생물 진화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공헌하였다.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영국의 산업자본주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며, 자유경쟁에 의한 번영의 이념을 생물계에 도입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종의 기원》이 종교적인 반감을 일으키면서도 급속히 보급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의 각 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를테면 H.스펜서가 제창한 사회다윈주의는 생존경쟁설(生存競爭說)에 따라 인종차별이나 약육강식을 합리화하여 강대국의 식민정책(植民政策)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다윈 이후 진화학설에 관한 논의가 그치지 않았는데 그 쟁점의 하나는 라마르크와 마찬가지로 다윈도 믿었던 획득형질(獲得形質)의 유전문제였다. A.바이스만은 이것을 부정하고 ‘생식질의 연속설’(85)을 제창한 사람으로, 자연선택만능을 부르짖었으므로 이것을 ‘신다윈설(Neo-Darwinism)’이라고 한다. 이 신다윈설에 맞서서 획득형질의 유전을 주장하는 ‘신라마르크설(Neo-Lamarckism)’도 나왔다. G.J.로마네스, M.F.바그너 등은 지리적 또는 생리적인 격리에 의한 교잡의 방지가 없이는 생물의 진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격리설을 주장하였다. 19세기 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윈설의 결함이 차차 드러나고 진화론에 입각한 계통탐구의 어려움이 인식되면서 생물학이 기재적 형태학(記載的形態學)으로부터 실험생물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진화론에 대한 관심이 차차 감소되었다.
진화론이 동인(動因)이 되어 움트기 시작하던 유전 연구는 1900년 멘델리즘의 재발견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전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유전자(遺傳子)의 불변성이 믿어졌고, W.L.요한센은 순계설(純系說:1903)을 내세워 선택은 순계의 분리에 소용될 뿐이며 환경에 의한 변이는 진화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H.드 브리스는 달맞이꽃의 연구로 돌연변이설(1901)을 세웠는데 진화는 순계에 있어서의 일련의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자연선택은 별로 역할이 없다고 하였다.J.P.로티는 교잡에 의하여 진화가 일어난다는 교잡설(1916)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20세기 전 사반기에는 진화학설이 일면화한 경향이 있었고 유전학의 초기의 성과가 유전의 고정성만을 강조하는 인상이 짙었던 탓 등으로 인해 진화의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종전의 여러 설에 회의를 품고 불가지론(不可知論)에까지 빠져, 이른바 불가지적 시대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사이에 진화에 대한 믿음이 동요된 것은 아니고, 진화의 이해에 공헌할 생물학의 여러 분과(分科), 특히 유전학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었다.얼마 안 가서 유전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돌연변이의 본질이 밝혀지고 생물학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집적됨으로써 진화의 경로 및 요인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돌연변이 ·교잡 ·격리 ·자연선택 등을 진화의 요인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적 종합설 시대가 오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T.도브잔스키의 《유전학과 종의 기원》(1937)에서 처음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45년 이후에 분자생물학(分子生物學)이 발달함으로써 분자 수준에서 진화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국에 진화론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이다. 1880년대에는 일본 사람들의 번역서 또는 저서를 통하여 진화사상을 받아들였고, 1900년대에는 중국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국은 엄복(嚴復) ·량치차오[梁啓超] 등 유럽의 진화론을 흡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량치차오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당시에는 자연과학적인 면보다는 사회과학적인 면이 먼저 받아들여져 1900년대 초엽에는 생존경쟁 ·우승열패 등의 술어가 보편화되었다.
(출처: NAVER 백과사전)
생명의 신비
달에 33개월 동안 있었던 가래 속의 박테리아
“1969년 아폴로 12호는 인류의 2번째 달 여행에 올랐고, 태양계 생명체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 버렸다.
‘아폴로 12호가 도전한 임무는 서베이어(Surveryer) 3호가 자리한 운석공에 정확히 착륙(pin point landing)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베이어 3호는 1967년 달에 착륙했고, 아폴로 우주인에게는 미개척지의 무인 길잡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우주선을 방문함으로서 보답하려 하였습니다.
‘미션 계획자들이 원했던 것은 마약 성공한다면 서베이어호 일부를 가지고 귀환해 이 구조물이 달에서 33개월을 지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 시험해 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33개월 동안의 절반 동안 받은 태양 방사선 총량 - 진공인 공간에 있었으니 거의 총양이지요. 그리고 화씨 -250 도(섭씨 -157)도에서 +250도(섭씨 121 도)에 이르는 실제로 거의 화씨 500도(섭씨 260도)에 이르는 일교차, 그래서 그들은 부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운석공을 발견해야 했다.
‘우리는 3일째에 달의 낮에 진입하고 있었고, 태양은 우리 뒤 15-20도 방향에 있었습니다. 착륙할 때가 되자, 우리는 착륙할 크레이터 패턴을 꺼냈고, 저는 달 표면 7,500 피트(2,250m)에서 착륙선을 기울였고, 달표면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크레이터 패턴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 없었습니다. 크레이터가 만개나 있었으니까요! 와 여기가 어디야? 하지만 AI가 나에게 내려다 볼 숫자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하자 그게 보였고, 그건 찾던 크레이터였고 우리는 그 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착륙하고나서 나는 크레이터 패턴이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서베이어호를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렸고, 처음 크레이터를 둘러보자 서베이어호가 거기 앉아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힘든 일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었지요’
그리고 피터 콘라드(Pete Conrad)는 어슬렁거리며 걸어가 공구(heavy duty bolt cutter)를 사용하여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로봇 탐사선에서 카메라를 잘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베이어호에서 TV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그들이 이걸 달 실험실(the lunar receiving lab)에서 열렸을 때 일인데, 분명히 3년전에 이걸 조립했을 때 작업자가 감기에 걸리거나 해서 스티로폼에 재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카메라 안에 말라붙은 돌기(spicule)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미생물 학자가 그걸 가져다 배양 접시에 넣었고, 이런 일이 박테리아가 살아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 [‘ ’]는 아폴로 12호의 선장인 Pete Conrad의 말)
아폴로 12호는 박테리아가 진공인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였다. 생명체는 상상했던 것 보다 강인해서 거의 파괴 불가능했다. 미생물이 한 천체에서 다른 천체로 여행을 했고, 그리고 살아남은 것이다.
20-30년 전에는 우리가 생명체를 보는 관점은 지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지구에 기원한다고 생각했고, 생명의 역사는 지구에 모두 쓰여져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가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알았고, 이웃이 우리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처: BBC the Planets, Episode 7, Life)
2억년전 소금 광맥 바닷물 속의 미생물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명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안은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라 대 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류의 선조는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랜 동안 연구원들은 생명이 이런 총체적인 증발이 있을 때마다 전멸했다가 또 다시 탄생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물이 총체적인 증발에서도 생존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 멕시코 주에서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 염호, 이 일대는 소금으로 이루어진 염호가 있습니다.
염호 - 바다로 이어지는 출구가 없고, 짙은 농도의 염분을 포함한 호수.
2억 5천만년전 여기에 드넓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염호는 바다의 융기에 의해 말라버린 자취입니다. 이 현대판 총체적인 증발이 당시 미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스트 체스터 대학의 미생물 학자 러셀 블릴랜드 박사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염호 바로 옆에 있는 방사선 폐기물 매립 시설입니다.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연장이나 장갑 같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건들을 지하에 묻는 시설물입니다. 이곳의 폐기 장소는 바닷물이 마를 때 생겨난 두께 약 1,000m에 이르는 지층, 암염속입니다. 암염은 조금씩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백년이 지나면 핵폐기물이 소금속에 완전히 갇혀버린다고 합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핵폐기물이 소금속에 갇히는 것처럼 당시의 미생물들의 흔적도 소금속에 남아있을 지 모른다고 여기면서 지하에서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이 지하 미로의 다양한 장소에서 암염을 채취합니다. 벽을 깍으면 곳곳에서 커다란 소금 결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매우 선명하게 나있는 줄무늬 때문에 아주 좋은 견본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매우 선명하게 나있는 줄무늬 때문에 아주 좋은 견본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엔 이첩기 해양에 있던 아주 작은 바닷물 물방울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바닷물은 2억년 동안 이런 결정속에 갇혀있습니다.’ (브릴랜드 박사)
이것은 박사에게 보석이나 다름없는 소금 결정입니다. 결정속에 작고 네모진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2억 5천만년전에 소금이 결정으로 변할 때 갇혀버린 바닷물로 소금 결정의 튼튼한 벽 때문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결정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던 물을 신중하게 꺼낸 다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에 박사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완전한 형태의 미생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달 동안 영양분을 주입하여 온 후에 일이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분열해서 증식을 시작합니다. 말하지만 2억 5천만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죠.
‘소금 결정속에서 찾아낸 그 세균은 죽어있지도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일종의 포자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득하게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면 상태의 놀라운 점은 영양분을 필요치 않고, 폐기물도 만들지 않는 채로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다시 생길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바닷물이 증발되는 와중에서 미생물은 그야말로 소금 결정에 갇혀버린 아주 적은 물에 생존을 건 셈입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다양한 장소로 진출해서 살아남은 그 강인함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라고 여깁니다.
‘생명이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태어난 생명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에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여름 방학 특선 앙코르 경이로운 지구 1. 지구 역사의 비밀, 2007년 8월 13일, 14:10-15:00)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 생명
“대서양 3,000m의 빛이 없는 어마어마한 수압하의 열수 바닷속에 살아가는 유황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와 멕시코만 수심 800미터에서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이 잠수정은 엘빈이다. 직경 2m의 원형 잠수정으로 조종사 1명과 조수 2명이 탈 수 있다. 벽은 티타니움으로 만들었고, 조명창은 작아야 한다. 창이 조금만 더 커도 잠수정은 이곳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기 십상이다. 엘빈은 수심 3마일 그러니까 4,500m 정도까지 잠수할 수 있다.
수심 약 3,000m 지점 대륙사면이 마침내 평평해 지면서 심해 평원과 만나게 된다. 심해 평원은 지구 표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대부분은 완전히 평지지만 군데군데 깊게 패여 있다. 곳에 따라선 수백 Km 넓이의 초대형 해구를 형성하고 있다. 심해에서 가장 깊게 패인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로 수심 7,000 내지 8,000m 가 넘는다.
심해 평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은 세계적으로 5대가 있다. 그런데 그 5대가 지금까지 탐사한 걸 다 합쳐도 전체 해저 평원의 1% 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저 평원은 대륙 사면에 비해 큰 물고기 숫자가 천배는 적다. 하지만 불가사리는 수없이 눈에 띤다. 먹이를 찾아 심해평원 밑바닥을 훑고 다니는 것이다.
깊디 깊은 해구 밑바닥에서도 물고기가 발견된다. 주로 한 어종이다. 민어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이것은 ' 래트테일 ' 이다. 래트테일은 해저 근처를 헤엄쳐 다니면서 감각 구멍을 동원해 썩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찾아다닌다. 래트테일은 먹이를 찾기 위해 심해평원을 온통 휘젓고 다니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한 곳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걸 좋아한다.
이것은 삼발이 고기다. 두 개의 특별한 지느러미로 몸을 지탱하며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삼발이고기는 눈이 있긴 하지만 거의 장님과 다름없다. 주로 머리 뒤의 한 쌍의 지느러미를 이용해 먹이를 찾아내는데 지느러미는 작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아주 예민하다. 우린 심해 평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바다 속에 들어갈 때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해에 사는 이 문어는 크기가 비치볼 정도이며 ' 덤보 ' 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촉수들 사이에 우산처럼 생긴 살갗 조직과 상하로 펄럭펄럭 움직이는 특이한 두 귀 덕분에 덤보는 힘들이지 않고 해저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다.
심해 평원의 한 가운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질 구조가 존재한다. 다름 아닌 대양 산령, 즉 대서양 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해저 산맥이다. 대양 산령은 해저산맥이다. 해저에서 3킬로미터 정도 높이에 길이가 4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이다.
1970년대, 마침내 탐사정들이 중앙해령 도달에 성공했다. 탐사정에 탄 학자들은 극히 이례적인 세계를 발견했다. 바다 속에 과거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수십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 학자들은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열수공들을 발견했다. 마치 펄펄 끓고 있는 납처럼 너무나 뜨거운 물들이었다.
물은 지상에서는 섭씨 100도에서 증기로 변한다. 하지만 이 심해에서는 바다물의 엄청난 압력 때문에 섭씨 400도의 뜨거운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선 잠수정이 조심해야 한다. 엄청난 고온과 고압에 둘러쌓여 있으므로 실수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 쉽다. 이곳엔 동물에게 치명적인 황화 수소가 가득하다.
그런 이곳에서 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발견했다. 일부 열수공은 하얀 관 같은 걸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하얀 관에는 처음 보는 종류의 다모류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섭씨 80도나 되는 온도에 노출돼 있었는데도 말이다. 지구상 어떤 동물도 그런 높은 온도에선 못 견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벌레들을 폼페이 벌레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열수공. 서로 다른 생물들이 뒤엉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분출구 열수공의 아랫부분은 큰 홍합으로 뒤덮혀 있었다. 하얀 게들도 떼를 지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장관인 것은 길이 2미터, 너비 4센티미터의 붉은 사관충들이었다. 사관충이 굴뚝 전체에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이들을 발견하기 전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칠흑같이 깜깜한 이 심해 세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전혀 에너지를 얻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인가?
해답은 사관충 안에 있었다. 서관충 안엔 특수 박테리아가 가득했는데 뜨거운 물 분출구에서 나온 유황 물질의 에너지를 빨아내는 박테리아였다. 사관충의 붉은 깃털은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황성분과 산소를 박테리아에게 공급해주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이 박테리아들이다.
홍합들도 박테리아로 가득했다. 햇빛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 생명의 기본이 녹색 식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박테리아와 그 밖의 미생물들은 5백여종이 넘는 이 곳 생물들의 먹이 사슬의 밑바닥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게와 새우는 박테리아를 먹어치울 뿐만 아니라 사관충의 깃털까지 도둑질하려고 한다.
1979년 생물학자들이 처음 이곳을 찾아온 이래, 매 10일마다 새로운 종류의 생물들이 추가로 기록되고 있다. 이 곳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물고기는 분출구 주변을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물고기의 후손들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몇몇 분출구들은 이미 지난 수십년간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 처음 이곳을 찾아왔던 생물학자들은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심해평원에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살고 있는 걸 보고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물론 바다에서 시작한 건 확실하다.
1990년, 심해를 탐사하던 잠수정들이 보다 더 놀라운 발견을 했다. 맥시코만 기슭, 수심 8백 미터가 조금 넘는 지점에서 우연히 수중 호수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했다. 호수의 길이는 20미터 정도였고 나름대로 모래사장도 있었다. 호수 가장자리 쪽으로는 조수의 흐름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기는 바다 속인데.
사실, 이 호수의 가두리를 치는 것은 주변 바닷물보다 농도가 진한 소금물이다. 소금 농도가 진한 만큼 무게도 더 나간다. 모래사장처럼 보이는 이것은 수십만 개의 홍합으로 이뤄져 있다. 학자들은 다시 한 번, 불모지 사막이나 다름없는 해저 한 가운데서 태양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별한 생명의 오아시스를 만났던 것이다. 이번 경우 에너지원은 유황 물질이 아니라 해저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른 메탄 가스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홍합 속에는 메탄 에너지를 가득 가진 특수 박테리아가 득실거렸다.
뜨거운 물 분출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박테리아를 기본으로 한 완벽한 생태계가 발달됐던 것이다. 너무 너무 다양하고 새로운 어종들이 많았다. 새우와 이상하게 생긴 가재류 붉은색 다모류 벌레들이 있었다. 뜨거운 물 분출구를 ' 열수구 ' 로 부른다면 이 오아시스는 냉용수 지역으로 부르기로 했다. 메탄 가스를 생산하는 이 해저의 지질학적 과정은 결국 수소 황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최초의 탐사자들이 이 소금물 웅덩이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사관충을 발견한 것은 그것도 수백미터에 달하는 사관충 벌판을 발견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종류의 사관충은 유황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박테리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바닥에서 직접 유황 물질을 뽑아내기도 한다. 이 아름다운 아가미는 박테리아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목적 밖엔 없다. 여기 있는 이 사관충은 나이가 자그마치 2백살이 넘는다.
뜨거운 물 분출구에서 자라던 사관충은 온 바다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척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사관충은 그보다 훨씬 늦다. 아마 단각류로부터 아가미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뜨거운 물 분출구 근처 동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갑자기 고갈될 수도 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지질학적으로 보다 안정된 미래를 누릴 수 있다. 지난 몇 십년 사이 인류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생태계를 2개나 발견했다.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해저 세계의 단 1퍼센트도 채 탐사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누가 알겠는가.“
(출처: BBC The Blue Planet, Ep.2. 바닷속 탐험)
육체 없이 살아가는 미세 에너지로 이루어진 생명 - 영혼
기감능력을 가진 필자가 기감하고 있는 인간은 육체와 미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 에너지는 계란처럼 생긴 입체 모양이고, 육체가 그 입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육체의 외부에서 미세 에너지가 흡입되어 각 기관으로 미세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 생명 현상에 사용되어지고, 잉여 미세 에너지는 체외로 방출되고, 다시 미세 에너지가 흡입 방출되는 (+)(-)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미세 에너지의 흐름으로 기감된다.

미세 에너지가 잘 통하는 사람의 기감도, 여러 층의 미세 에너지가 기감된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기감해 보면 미세 에너지가 배에서 가슴이나 머리에서 빠져 나온 사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가 기감이 된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사람을 기감해 보면 미세 에너지가 육체에서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나 미세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잠을 자고 있는 남자의 미세 에너지 그림, 미세 에너지가 정수리에서 빠져나와 있다.
임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육체에서 미세 에너지가 임종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임종 전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희고 반짝이는 미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 기감된다.

임종하고 있는 노파의 미세 에너지 그림, 육체를 둘러싼 미세 에너지가 불이 꺼져 가고있는 것 같이 어둡다. 파란색 미세 에너지가 정수리로 빠져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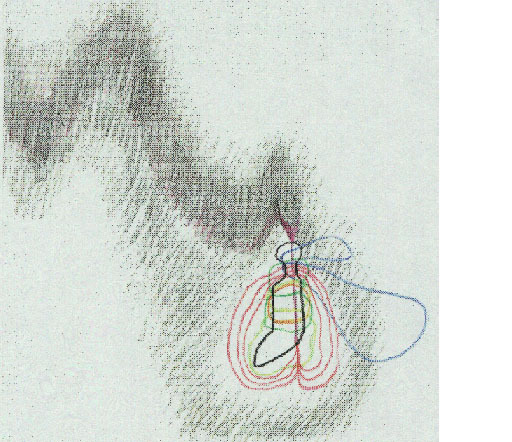
임종하기 한달 전의 노파의 미세 에너지 그림. 미세 에너지가 머리로 새어 나가고 있다.
미세 에너지가 계란 모양으로 육체와 잘 맞는 경우는 건강한 상태이나, 미세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빠져 나와 있는 경우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이고, 미세 에너지가 육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임종을 맞게 되고, 육체에서 빠져나온 미세 에너지는 하늘을 향해 뜬 상태로 공간으로 흩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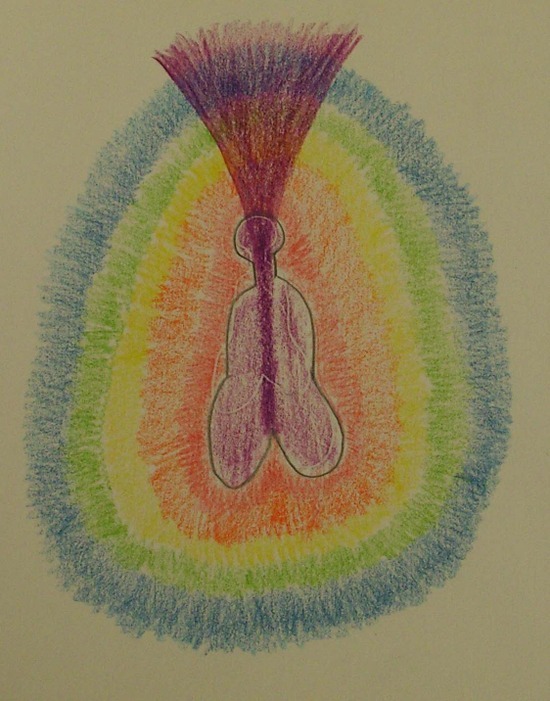
필자가 장시간 기공 수련을 하고 난 후의 미세 에너지 그림
필자가 수련을 몇 시간 행하여 미세 에너지가 통하는 기문과 기도가 완전히 열린 후에 유체이탈을 해보면 필자의 미세 에너지가 위로 뜨면서 하얀 빛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하늘 방향으로 떠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데,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갔다가 필자의 육체가 약해지지 않는 시간과 거리 내에 육체로 다시 돌아와야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이나 너무 멀리 올라가면 필자의 미세 에너지가 약해지게 되면서 미세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으로 육체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가벼운 미세 에너지로 그것이 육체를 떠나가면 인간의 육체는 황폐하게 되면서 죽음을 맞게 된다. 이 가벼운 흰빛의 반짝이는 미세 에너지는 기감해 보면 기감추의 움직임이 시계 방향 회전하는 양(陽)의 극성(+)을 가진 미세 에너지로 기감된다. 전자기파를 기감해보면 차갑고 기감추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음(陰)의 극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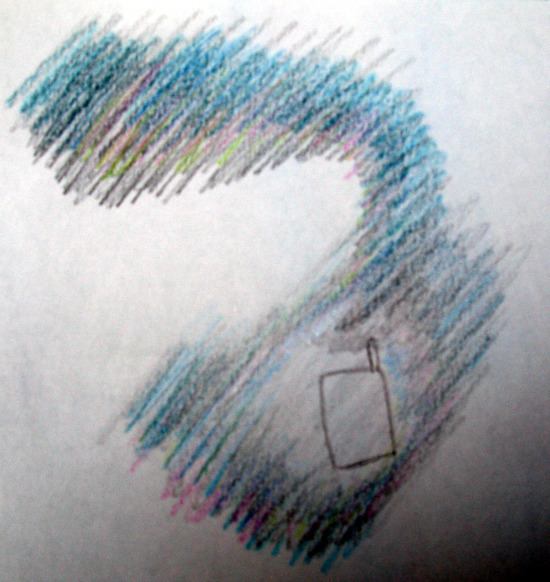
핸드폰의 미세 에너지 그림, 차갑고 어두운 미세 에너지가 기감된다.
이 양의 미세 에너지는 가볍고 따뜻하고 반짝이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필자는 기감하였고, 전자기파와는 반대의 극성이나 전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라디오나 TV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안테나와 수신 장치만 있으면 그 신호를 잡아서 증폭하여 재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지구에서와는 다른 환경이나 조건하에서도 수신기나 증폭기가 갖춰지면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학 기술은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알려진 영혼의 영역까지 도달하리라 예상된다.
임종할 때 미세 에너지가 무겁게 가라앉아 한 곳에 머물게 되는 지박령이나, 갈 곳을 모르고 이리저리 떠도는 부유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미세 에너지를 가진 영혼이 되지 않도록 육체가 미세 에너지를 운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미세 에너지에 대하여 공부하여야 한다.
영혼은 육체가 없는 미세 에너지만을 가진 존재이다. 미세 에너지는 전자기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나 전파 같이 빛의 속도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가 없이도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하는 생리 현상도 없고 오감의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상태이다.
영혼은 극히 미세한 미세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진 모든 정보가 영혼의 미세 에너지 속에 보관이 되고, 이승을 떠나서는 중간계와 저승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생명의 미세 에너지의 근원으로 가고, 다시 이 정보의 축적이 근원에서 공유되면서 미세 에너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가진 미세 에너지의 상태로 육체를 가진 생명으로 리사이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감 능력을 가진 필자가 보는 생명은 물질과 미세 에너지가 결합 되어야 비로소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으로 기감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지구와 우주에서 오는 미세 에너지로 가득한 공간으로 여러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고 진화하고 있는 여러 생명으로 넘쳐나는 곳이다.

(사진 출처: NASA,
http://www.nasa.gov/vision/earth/features/bm_gallery_6.html )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진, 즉 물과 탄수화물로 되어있는 생명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한다. 우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은 진리의 바닷가에 뒹구는 모래사장 위의 조그만 조가비 몇 개일 지도 모른다.
(진리의 거대한 바닷가에 뒹구는 모래사장 위의 조그만 조가비 출처: "뉴턴 자신은 그의 우주의 이해가 불완전하다고 의심했다: '나는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자신에게 나는 진리의 거대한 대양이 내 앞에 발견되지 않고 있는 동안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가비와 매끄러운 돌을 발견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해변에서 놀고 있는 단지 조그만 소년으로 여겨진다."
"Newton himself, however, suspected that his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was incomplete: 'I do not know what I am appear to the world, but to myself I seem to have been only little boy playing on the seashore, and diverting myself now and then in finding a smoother pebble or a prettier shell than ordinary, whilst the great ocean of truth lay undiscovered before me.' " 출처:simon singh, big bang, harper perennial, new york, 2004. p.119)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기감 능력을 가진 필자가 보기에는 인간은 육체가 없어도 존재하는 미세 에너지와 육체가 결합된 존재이고, 물질의 우주와 미세 에너지의 우주가 같이 가면서 진화하고 있는 존재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계와 영혼의 세계인 미세 에너지계는 서로 겹쳐져 있고 미세 에너지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